나는 하루키를 좋아한다.
정확하게는 하루키의 에세이를 좋아한다. 애초에 소설을 많이 읽지도 않았거니와 성적 대상화가 많은 건 딱 질색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명한 하루키의 소설을 읽을 이유는 없었다.
처음 하루키의 에세이를 읽은 건 고등학생 때다. 그 시절은 공부빼고 다 재밌는 법. 도서관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책이나 빌려 봤더란다. (뭐, 책 읽으면 다행인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직접 지은 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밸랜타인데이의 무말랭이> 따위의 이름은… 지금도 취향 저격인 것이다.

하루키의 에세이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내 취향 저격인 삽화가 있기 때문이다. 안자이 미즈마루씨의 그림은… 정말 내 취향이다. (내가 그리는 그림과 비슷하기도 하고…) 뭐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정말 그림이 내 맘에 든다는 것이 전부라.

좋아하는 책들을 꼽자면, 무말랭이 녀석, <코끼리공장의 해피엔드>, <이윽고 슬픈 외국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강추!) 정도.
읽다보면… 친근감이 쌓이는데 ‘역시 대작가! 존경스러워!’ 류 라기보다는 ‘이 녀석…’ 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 녀석의 에세이는 굉장히 심플하다.
굴비 엮듯 소재를 이어가는 게 아주 매력적이다. 그니까 이런 거다. 그냥 A 얘기를 하다가… 어어 갑자기 구렁이 담 넘어가듯 B에 대한 결론이 나 있고 수긍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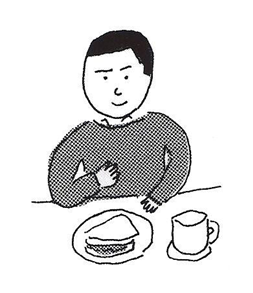
이 부분은 또 다른 에세이 <잡문집>에 한 꼭지로도 나와있는데, 이름이 뭐더라요.
아. 굴튀김. 굴튀김이론입니다.
'사랑’을 추상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어렵지만, 좋아하는 굴튀김(웩)으로 시작하는 사랑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다 – 뭐,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김이나 작사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디테일하게 묘사했을 때 공감을 확 하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
그니까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것 마냥 떠들 필요 없이, 본인의 경험에서 얻은 작은 점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것. 이게 하루키의 에세이에 살아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대놓고 성실해서 좋다.
영감 받을 때만 일필휘지로 글을 써내려 간다던 유명 소설가라던지, 베일에 가려진 예술가라던지. 뭐 그런 류가 아니어서 맘에 든다. (내가 그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한다. 뭐!)
그 누구보다도 규칙적인 생활, 운동, 정해진 시간에 쓰는 글쓰기까지. 정말 무난하고도 계획적인 양반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할 수도 있고.
하루키가 뛰어나지 않다는 점이 아니다. 분명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취미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다는 거다.
웃긴 건 책 리뷰를 하겠다고 해놓고 팬심을 늘어놓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군요. 더 웃긴 건 하루키 리뷰는 하루키 말투로 하고 싶어 진다는 거다.

‘아무튼, 하루키’가 나온 걸 보고 문득 ‘아, 나 하루키 좋아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는 그다지 찾지 않은, 잊고 있던 맛집 느낌.
앞서 말했듯이 나는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루키의 소설도 마찬가지다. (사실 안 읽어봤다.)
이 책은 하루키의 찐팬인 작가가 그의 책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루키의 소설 그 자체는 구미가 안당기지만, 이 작가의 경험과 감각적인 표현들이 되려 하루키의 소설을 읽고 싶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남이 나한테 끈적하게 굴어주는 건 대체로 좋았지만 내가 그러기는 싫었다. 자존심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끈적하게 굴었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거부당할 것이 무서워서 아주 언제부터인가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루키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1년 내내 서리제거제를 넣어주어야 하는 구식 냉장고를 쿨하다고 부를 수 있다면, 나 또한 그렇다” 라고 썼는데, 연중 노력해야만 담백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을 담백하다고 할 수 있다면 당시의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하루키가 마냥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책은 ‘팬심으로 참아줬다’고 하기도 하고, 하루키식 여성 서술에 대한 회의감도 이야기한다. 모여 토론하는 장면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난 지금 나이 먹어서 보니 다자이 오사무(인간 실격의 작가)가 훨씬 좋아. 왜냐면 그게 훨씬 솔직한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하루키는 그런 걸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는 작가고, 모든 것에 거리감을 둔 채 ‘난 휘둘리지 않아, 난 상처 받지 않아’ 하면서 그런 애티튜드로 살아가는 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굴잖아. 그게 어렸을 때 더 먹히는 것 같아. 그러니 나이 먹을수록 다자이가 더 진짜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
원고를 쓸 때면 하루키의 책이 등장하는 내 인생의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뒤져봤다. (중략) 한 작가의 작품들이 닻이 되어 내 인생의 소소한 기억이 세월에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게 거의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이라면, ‘사랑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구나.’라는 생각이다. 나는 작가의 하루키의 작품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
흔히들 사랑, 이라고 하면 (나도 그렇고) 사람 간의 사랑을 생각한다. 것도 잔잔하면 안 된다. 구구절절하고 굴곡 있는 애정전선,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딱지가 붙어도 될만한 것이었다.
감정에 층위를 정해서 여기까지는 좋아하는 거고-여기까지는 사랑이고!라고 선을 긋는 건 뭐, 주관적인 영역이라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싶다.
비록 농도가 옅은 사랑일지라도 사랑이라 느끼고,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삶에 숨을 불어넣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고로 나는 사랑한다. 나와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루키의 에세이도 조금.
읽은날짜 : 20년 2월 9일
정리날짜: 20년 10월 1일
- 저자
- 이지수
- 출판
- 제철소
- 출판일
- 2020.01.31
'고독한 독서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 서울대 교수의 하이데거 명강의 (2020 BEST 책추천) (0) | 2020.10.22 |
|---|---|
| 행복의 이미지의 범람 속에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0) | 2020.10.18 |
| 나의 삶에서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 :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톨스토이> (2) | 2020.09.28 |
| 사법고시는 옳고 로스쿨은 옳지 않다? : 책 <당선, 합격, 계급_장강명> (0) | 2020.09.21 |
| MBTI 불신론자의 MBTI 뿌시기 : 책 <성격을 읽는 법> (0) | 2020.09.18 |